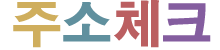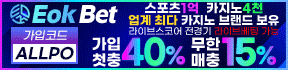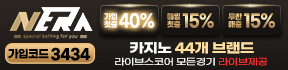노가다 하다 만난 안전감시단 누나2
★ 국내 유일 무료배팅 커뮤니티, 무료 토토배팅가능 ★
그 누나의 숙소와 내가 머무는 숙소는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였다. 나는 33평 아파트에서 팀원 6명이랑 부대끼며 살았는데, 누나는 원룸에서 같이 일하는 30대 아줌마랑 둘이 지낸다고 했다.
토요일. 일을 마치고 숙소에서 얼른 씻은 나는 누나와 만나기로 약속한 PC방으로 향했다.
오후 5시 무렵으로 기억한다. 그 누나는 가벼운 차림새로 왔다. 버프(자외선과 먼지를 막기 위해 얼굴에 두르는 천)를 착용하지 않은 누나의 얼굴은 귀염상이었다.
나와 누나는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아 오버워치를 켰다.
이 누나와 둘이 게임을 한다는 사실에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론 실력이 뽀록날까봐 두려웠다.
잘한다고 입을 털어놨는데 보잘 것 없는 실력을 내보이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까......
근데 게임을 켜는 중에 누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버워치 잘 하는 방법좀 가르쳐 줘요."
"ㅋㅋㅋ왜요? 오버워치 방송 하려고요?"
"아니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하려는데 제가 게임을 안해봐서요. 배우고싶어서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돼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누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타지에 일을 하로 왔다. 아마 돈 문제일 것이다. 아무튼, 누나는 고향에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녀들은 모두 오버워치를 한다고 했다.
타지에 있으니 직접 만나지 못하고 게임으로나마 만나서 같이 즐기려는데, 누나 빠고 다들 오버워치를 꽤 하는 친구들이라 그들 사이에 껴서 게임을 못하겠다는 거다.
보아하니 이 누나는 오버워치를 시작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뉴비중의 뉴비였다. 더구나 원래도 게임에 별 취미가 없어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모르고 있었다.
나도 오버워치를 별로 안해봤지만, 대한건아로서 지난 몇 년간 이 게임 저 게임 하던 짬밥이 있었고 이 누나 입장에서는 나도 꽤 잘해보이는 착시를 일으키기 충분했다.
비유하자면 굼벵이 앞에서 주름 잡지는 못할지언정 가래떡 앞에서 주름잡는 시늉은 할 수 있던 것이다.
나는 누나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며 같이 플레이를 했다. 나는 파라를 픽했고, 이 누나보고는 메르시를 픽하라고 한 뒤 나를 따라다니며 힐만 해주면 된다고 했다.
사실 이전까지 내 역할이 친구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힐을 해주는 메르시였다.
어쨌건 그날은 별탈없이 3시간정도 게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무표정한 그녀였지만 함께 이기고 지고 할 때마다 웃거나 탄식하는 등 반응을 보였고 그 모습이 무척 귀여웠다.
게임에 내력이 없는 누나는 세 시간쯤 지나니 슬슬 지쳐갔고 우리는 피시방을 빠져나왔다.
"밥이나 먹을래요? 제가 살게요."
"네. 밥 먹어요. 근데 제건 제가 계산할게요."
"아 그런데 그쪽 이름이 뭐에요? 아직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
"아... 전 AAA에요."
"전 KKK에요."
"아... 네."
우리는 뭘 먹을까 하다가 동네에 있는 24시간 국밥집에 갔다. 그녀가 먼저 국밥을 먹자고 한 것이었다.
레스토랑이라도 데리고 가야하나 비쌀텐데, 이런 고민을 했던 내게 참 고마운 제안이 아닐 수 없었다.
국밥집에 가서 소주도 안 시키고 국밥 두 개만 달랑 시켜서 이런 저룬 얘기를 나누었다.
"되게 어려보이는데 몇살이에요?"
"저 안 어려요."
"몇 살이신데요?"
"25이요."
"네??? 저보다 누나시네요."
당시 난 23살이었으니, 나보다 2살 연상의 누나였던 것이다. 나이 밖에도 일 얘기, 숙소 사는 얘기 등을 나누었다. 개인적인 얘기들. 이를테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일 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등은 물어보지도, 질문 받지도 않았다.
왜냐면 서로가 그런 질문들은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단 것 같다.
사실 공사판이 인생 막장들이 최후의 보루로서 오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으니까.
우리는 정말 건전하게 밥을 먹었다. 그리고 서로의 연락처를 받은 뒤 깔끔하게 헤어졌다.
그 후 몇주간은 정말 건전하게 보냈다. 현장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꾸벅여 인사를 나누고, 주말에 같이 게임을 했다.
게임을 하며 서로 말도 놓고 친해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벽이 있었다. 서로의 사생활은 묻지 않고, 게임이나 밥 이상의 교루는 나누지 않는.
물론 나는 이 누나와 좀 더 진도를 나가서 술도 마시고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모텔방까지 입성하는 상상을 매번 했다.
하지만 괜히 그런 짓을 시도하려 했다가 지금 관계가 파탄날까봐 그러지 못했다. 어쨌건 집떠나와 친해진 첫 또래 여자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우리는 주로 토요일 저녁에 만났는데 이 누나가 먼저 내게 술을 한잔 하지 않겠냐고 권했다.
우리는 허름한 호프집에 가서 치킨에 맥주를 시키고 술을 홀짝였다. 근데 누나 표정이 어두웠기에 내가 먼저 화두를 던졌다.
"누나 무슨 고민 있어요?"
"고민....까지는 아닌데"
술이 들어간 누나는 막힘없이 고민을 꺼내놨고 요점은 이거였다. 공사현장에서 본인에게 집적대는 남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사실 나도 어느정도 알고는 있었다. 우리 팀뿐 아니라 어느 곳에사도 누나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 남지이고, 여자라 해봐야 40대 아줌마가 주를 잇는 이곳에서 20대 여자가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했다.
근데 내 생각보다 덩도가 더 심했다.
허구헌날 남자들. 20대는 고사하고 30대, 40대 심지어 머히 희끗한 할배들까지 작업을 건다는 것이다.
자기는 그런 제안들을 칼같이 잘라 거절했는데,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안전감시단 아주머니들한테 가서 자기가 싸가지 없다는 둥 흉을 보는 사람들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나는 딱히 할 말이 없었다. 어찌보면 나랑 그들이랑 근본적으로 차이도 없을 테니.
나는 적당한 위로의 말을 건냈다.
"남자친구라도 하나 만들면 되죠."
"남자가 있어야 남자친구를 만들지. 그리고 내 처지에 무슨...."
"그럼 그냥 남자친구 있다고 해요. 그러면 좀 낫지 않으려나?"
"그럴까? 네가 내 남자친구라고 할래?"
"ㅋㅋㅋ네? 뭐 누나가 편하면 그렇게 하세요ㅋㅋ 누나 그런데 나는 왜 만나요? 나도 처음에 누나한테 영화 좋아하냐고 그랬는데 집적댄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작업 건 거였니? ㅋㅋ 글쎄. 넌 착하게 생겨서."
우리는 그날 딱 적당히 취기가 오를 때까지만 맥주를 마시고 헤어졌다. 그때는 누나란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떡을 치고 뭐고 그런 마음은 들지도 않았다.
그 날 이후 우리는 계속 만나서 오버워치를 했고 또 가끔 술도 마셨다. 노래방을 가기도 했고 버스타고 몇 정거장 가서 볼링을 치기도 했다.
그리고 대망의 그 날이 밝았다.
[클릭] 남자를 울리는 펠라치오 비법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