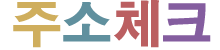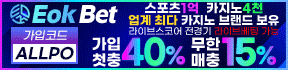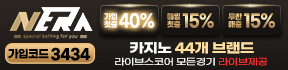노가다 하다 만난 안전감시단 누나 1
★ 국내 유일 무료배팅 커뮤니티, 무료 토토배팅가능 ★
때는 바야흐로 작년 이맘때.
군대를 갓 전역한 나는 진로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은 적성에 맞지 않았고, 그렇다고 마땅히 하고싶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설상가상 개인적인 가정사로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닐 정도로 기울어져 있었다.
전역 후 여행을 간다던가, 이리저리 유흥을 하며 지난 날 쌓인 회포를 풀 여력이 되지 않았다.
돈이나 벌자. 이 생각에 나는 전역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성 건설현장에 숙식 노가다를 갔다.
숙노 생활을 그리 고되지 않았다. 막노동이라곤 하나 일의 강도가 그리 쎄지 않았고, 말년에 군기 다 빠졌다곤 해도 아직까지 미약하게나마 군인정신이 박혀있었기에 묵묵히 일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슬슬 여름날씨가 낯짝을 들이밀던 6월 무렵. 그녀를 만났다.
공사현장엔 「안전감시단」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단어 그대로 공사현장의 안전을 감시하는 존재다.
보통 40대 아줌마 혹은 알바를 뛰러 온 청년들이 많다. 그런데 웬 이쁘장한 20대 여자가 안전감시단 하이바와 경광봉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닌가?
그녀는 160 초반의 아담한 키에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 도저히 막노동 현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앳된 얼굴이었다.
솔직히 안전감시단 조끼와 하이바가 아니면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실제로 그녀와 말문이 트기 전까지 누나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녀는 현장에서 일하는 남자들에게 당연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저렴한 얘기가 오가는 그곳에서 심심찮게 그녀를 희롱하는 말이 오갔다.
나도 남자고 고추가 달려있으니 당연히 그녀에게 눈길이 갔다. 하지만 티내지는 않았다. 당시에 난 누굴 만나고 따먹고 나발이고 그럴 여력이 없었으니.
그러다가 우연히 그녀와 말문이 트일 일이 생겼다.
11시 30분에 오전작업이 끝나고 밥을 먹으면 1시까지는 쉬는 시간이다. 보통 한적한 곳에서 낮잠을 자곤 한다. 나도 그늘진 곳에 누워 잠깐이나마 쪽잠을 즐겼다.
그날도 밥을 먹고 평소처럼 담배 한 대 피우기 위해 흡연장소로 향했다. 삼성현장은 흡연에 대해 무척이나 엄격하기 때문에 지정된 흡연 장소가 아니면 절대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흡연장에 그녀가 등판한 것이다.
그녀가 품에서 담배 한 대를 물고 입에 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여자도 담배를 피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내쪽으로 다가왔다.
"저기... 불좀"
"불요? 아 네네...."
허둥지둥 라이터를 꺼네 불을 붙여준 것. 그게 나와 그녀의 첫 대화였다.
나는 그때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녀에게 말을 붙여야겠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평소 친해지고..... 아니 따먹고싶다고 생각해왔고, 우연히 말을 붙인 이때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일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물었다. 그녀의 살짝 당황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는 듯하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담담히 대답했다.
"글쎄요... 별로 힘들지는 않아요."
난 계속해서 그녀에게 말을 붙였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확실한 건 별 시답잖은 이야기였다는 거다.
수박 겉핥듯한, 영양가 없은 질문들.
담배 한 개비가 다 타는 짧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녀가 미련없이 떠나는 그런 대화였다. 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흡연장에서 그녀를 찾았다. 다행히 그녀는 남들만큼이나 담배를 자주 폈고, 지정된 흡연장소가 몇 군데 없기에 그녀를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그 생각이 당시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토요일이었다. 토요일은 연장 작업이 없으면 작업이 일찍 끝난다. 대략 오후 3시 전에는 일이 끝나는데, 그 날 흡연장에서 또 그녀를 봤다.
처음 대화를 나누고 거진 2주는 지난 시점이었고, 그녀는 자기가 내게 담배불을 빌렸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성 싶었다.
나는 담배를 피다말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
"주말에 뭐하세요?"
"네?..... 그냥 숙소에 있는데요."
"아.... 영화 좋아하세요?"
"아니요."
딱 저랬다. 무슨 생각으로 영화를 좋아하냐고 물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개쪽팔리는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단칼에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그녀였다.
나는 그때 체념했다. 아 나는 병신이구나. 하긴 지금 내 처지가 벼랑끝인데 영화는 니미.
그런데 그녀가 말했다.
"게임 해요?"
"게임이요? 네 하죠. 무슨 게임 하세요?"
"오버워치요."
"아 저도 오버워치 해요."
"잘해요?"
오버워치. 고딩때 친구들 따라, 군생활 할 때 동기들 따라 몇 판 한 게 전부였다. 나는 게임을 하면 롤만 했던 진성 롤충이었다.
그런데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난
"웬만큼 하죠. 같이 할래요?"
내 되지도 않는 허세에 그녀는 대답했다.
"네."
[클릭] 전세계 모든 여성의 클리를 강타한 새티스파이어 [클릭]